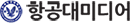평소에 더러운 걸 잘 못 견디는 성격인 필자는 종종 대청소를 한다. 대청소라고 해봤자 두세 평 남짓의 내 방을 청소하는 것이지만, 들이는 시간과 청소 후에 버리는 물건을 보면 ‘대(大)’청소라고 해도 무방한 듯하다. 가장 청소가 잘 되는 때는 시험기간 자정 즈음. 시험공부를 해야 하는데, 무언가 잔뜩 쌓여 공부할 맛이 안 난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청소를 시작한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그 조용한 밤에 혼자 땀을 흘려가며 청소를 하다보면, 혼잣말로 이런저런 말을 내뱉곤 한다. ‘이런 게 있었네’, ‘이건 왜 샀지’, ‘언젠간 쓰게 될 거야’ 등등 그 작은 방 하나를 청소하면서도 참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 두어 시간에 걸쳐 청소를 다 끝내고 나면, 이 작은 방 하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데에도 수많은 시간과 땀방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것을 ‘버려야 했다’는 걸 깨닫는다.
내가 성인이 되기 전인 2010년, 강우석 감독의 영화 <이끼>가 개봉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개봉 전부터 많은 화제를 불러 모았다. ‘이장’의 캐릭터를 소화하기 위한 정재영의 파격적인 분장과, 163분이라는, 지금으로 따져도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긴 러닝타임은 관객들의 기대를 한층 끌어올렸다. 개봉 후, <이끼>는 5일만에 100만이 넘는 관객을 불러 모았고, 각종 영화제에서 상을 휩쓸며 작품성까지 인정받았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후, 당시에 보지 못했던 <이끼>를 보게 되었다. 두 시간 반이 흐른 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감과 동시에 내 마음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이 가득 들어찼다. 영화는 선이 승리하고 악이 패배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다. 영화 속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장의 사망 이후에도 계속 일어나겠지. 이장과 연관된 모든 ‘썩어빠진’ 인간들은 여전히 떵떵거리고 서로의 잘못을 눈감아주며 살아가겠지. 이들은 영화의 제목인 ‘이끼’처럼 쉬이 사라지지 않고 더욱 단단히 눌어붙어 끊임없이 그 영역을 넓혀나가겠지. 이런 불편하고 기분 나쁜 감상만이 남아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나를 조사할라카믄 이 대한민국을 싸그리 다 청소해야 할 끼야!”라는 이장의 자신 있는 외침은 나를 ‘넉 다운(Knock Down)’시키는 카운터 펀치였다.
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를 분노케 했다. 아니, 분노를 넘어선 허탈함과 무력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들을 끝없이 ‘넉 다운’ 시켰다. 이는 단순히 내가 좋아했던, 믿었던 사람이 도덕적이지 못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서로의 부끄러운 치부와 민낯을 가려주기에 급급하고, 혹여나 그와 연관되어 나까지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입을 닫는 그 치졸하고 더러운 모습들에 ‘기가 차기’ 때문이리라. 심지어 그 수많은 ‘이끼’를 없애야 하는 사람조차 그저 또 다른 모습의 ‘이끼’임이 드러났을 때, 그 때의 배신감은 모두를 허탈하게 만들기 충분했다. 물론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올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필자인 나 역시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다 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상대방의 옷에 먼지가 묻었을 때 이를 털어주지는 못할망정 ‘저 정도 먼지는 묻을 수 있다’면서 조용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제 아무리 더럽다 하여도 이를 손대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더러운 건 그대로 남아 다른 깨끗한 것들마저 더럽히게 될 테니까.
어두운 바위틈에 낀 이끼를 없앨 때에는 이끼를 ‘완전히’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 조금이라도 이끼가 남게 된다면, 이는 마치 꼬리가 잘린 도마뱀처럼 다시 살아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전과 똑같은 상태가 된다는 말이다. 깨끗한 방을 만들기 위해 대청소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구석으로 밀어놓은 뒤 못 본채로 내버려 둔다면, 그 순간은 깨끗해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언젠가 다시 버려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여태껏 흘려보지 못한 땀방울을 흘려야 할 수도 있다. 힘에 부쳐 그냥 무시한 채 내버려두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칼을 뽑아야 한다. 어두운 바위 속을 들여다보고 이끼의 그 깊숙이 박힌 뿌리까지 모두 뽑아낼 때다. 방에 남아있는 그 수많은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할 때다. 이상의 <날개> 속 마지막 구절을 비틀며 글을 마친다. 버리자. 버리자. 버리자. 깨끗이 버리자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