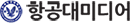한국항공대학교 신문사의 수습기자로서 처음 써보는 칼럼이라 고민을 많이 했다. 고심 끝에 주제를 정했지만, 과연 다뤄도 될 내용인지 고민을 또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 우리 학교의 사람들이 형제자매가 있다면 적어도 ‘나’처럼 후회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적어본다.
우리의 삶은 희로애락이라고, 행복과 슬픔이 공존한다. 하지만 그 슬픔이 해결될 수 없는 슬픔일 때, 그것은 배가되어 느껴지는 것 같다. 우리는 삶에 있어 터닝 포인트를 가진다. 그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필자와 같이 벌써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내 인생은 크게 동생이 있었던 과거와 없는 현재로 구분된다.
작년 4월, 벚꽃이 한창 예쁘게 피던 때, 예쁜 내 동생은 하늘나라로 갔다. 아침에 봤던 동생을 병원 응급실 침대에서 마주친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동생의 텅 빈 방을 마주하였을 땐, 말로 다할 수 없는 공허함뿐이었다. 며칠 전과 똑같은 방일 뿐인데, 동생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매우 컸다. 시간이 지날수록 동생의 체취는 사라져갔고 49제를 지낸 날들, 동생의 생일,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다. 동생에게 못해준 것들만 떠오르고, 내가 했던 못된 말과 행동들이 떠올라 나는 스스로를 내 안에 가뒀던 것 같다. 그렇게 나는 강박증과 우울증을 겪었고 사실 아직도 안고 있는 것 같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풍선을 안은 것처럼. 대학에 입학후 집에서 멀리 떠나와 생활하며 동생을 생각하는 시간은 예전보다 줄었다. 나쁘게 생각되지만 동생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한 것을 지킨다는 핑계로,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실 동생을 많이 생각하지 않으려고도 한다.
인간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다양한 평가를 받는 것 같다. 많은 선생님과 친구들이 동생을 좋은 사람으로 기억해주는 것을 보며 나도 누군가에게 오래 기억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소중했던 사람으로, 자신의 기쁨과 슬픔 모두를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기에, 그런 면에서 동생이 자랑스럽고 한편으로는 부럽다.
나는 여전히 미안함밖에 생각나지 않아서 동생 생각만 하면 마르지 않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할 뿐이다. 주변 사람들의 언니나 오빠와 싸웠다든가 동생과 뭘 먹었다든가와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다들 있을 때 잘하면 좋겠다. 적어도 나처럼 후회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한 사람을 잃고서 후회하면 이미 너무 늦어버린다. 너무나도 상투적인 말로 들리겠지만, 내 동생이 다시 내 곁에 돌아온다면 나는 내 인생을 버리고서라도 동생에게 잘해줄 것이다. 해결될 수 없는 슬픔과 후회를 안고 살아가는 것의 무게를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 기자명 이수연 수습기자
- 입력 2019.06.03 00:00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