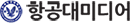‘진도에는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진도를 안 와요. 진도대교를 안 건너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시민 작가가 진도를 다녀온 뒤 꺼낸 말이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진도개와 함께 뛰어 놀 수 있는 진도개 테마파크. 조선시대 남화의 대가였던 소치 허련(小痴 許鍊) 선생의 온기가 서린 운림산방. 뿌옇고 붉게 물든 남해의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세방낙조 전망대. 그렇다. 진도에는 좋은 게 많다. 그러나 우리는 진도대교를 건너지 않는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30분. 476명의 탑승객을 태운 여객선이 진도 해상에서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렇게 진도의 시간은 멈췄다. 여객선은 진도 앞바다를 지나가기 꺼려했다. 진도를 향하던 사람들의 발길도 점차 끊겼다. 진도가 삶의 터전이었던 사람들 또한 비극에서 쉽사리 헤어 나오지 못했다. 사고가 발생한 팽목항 주변에는 유가족의 통곡 소리와 위로를 담은 노란 리본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비극적인 일을 겪은 당사자들을 위로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 말이다. 진도의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하는 소리도, 진도개와 뛰어 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인간에게는 ‘공감(共感)’이라는 능력이 있다.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 능력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의 위대한 가치인 사과도, 용서도 가능케 한다. 인류애와 사랑의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그리고 인간관계와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경이로운 만병통치약의 역할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공감이라는 내재된 능력이 있기에, 내가 상처입고 싶지 않은 것처럼 다른 누군가도 상처입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때때로 이 능력이 잘못 발휘되어 슬픔을 극복하는 힘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타인의 아픔이 왠지 나로 인해 발생한 것 같아 괜스레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 원인이 내가 아님에도 미안한 마음에 그 사람과의 대화나 만남을 피하게 된다. 슬픔을 기피하는 것이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이라 착각하기도 한다. 결국 상처를 입은 당사자가 아닌 내가 더 큰 슬픔 속으로 침전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누구의 상처도 아물지 못한 채로 남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감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아니다. 타인의 감정을 나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그가 슬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예전의 모습으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즉, ‘성숙한’ 공감을 해야 한다. 아픔을 견뎌내고 더 단단해진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슬픔을 웃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하여 결국 예전의 모습을 되찾는 것. 한 층 더 성숙해진 공감은 이를 가능하게 한다. 그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타인에게 제대로 된 공감을, 위로를 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글의 첫머리로 되돌아가 나에게 묻는다. 나는 진정으로 성숙한 공감을 하고 있었나. 슬픔을 기피하는 게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이라 착각했던 것은 아니었나. 어쩌면 나는 잘못된 공감의 방식으로 그들을 더욱 나약하게만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니었나. 유시민은 말한다. ‘진도에는 위로가 필요하고, 그 위로는 말로 하는 위로가 아니라 진도대교를 건너는 것’이라고. 유희열 또한 ‘시인과 촌장’의 <풍경>이라는 노래를 인용해 이렇게 덧붙인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