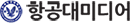청주 음주운전 역주행 사건, 한 20대 여성이 음주를 하고 역주행을 하여 60대 부부가 운전하는 차를 들이받아 한 가정을 풍비 박살낸 사건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여성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일의 판결만을 내렸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자, 시민들은 대신하여 피의자의 가게로 찾아가 마케팅적으로 불이익을 준다던가 하는 등의 나름대로의 응징을 가했다. 다른 사건을 한 번 보자. 송도 불법주차 사건, 단지 내 불법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자 불만을 품은 차주가 주차장 입구를 막아 시민들의 원성을 샀던 사건이다. 이 경우에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는 공권력 대신 시민들이 나서서 나름대로의 응징을 가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공권력의 행사에 불만을 가진 시민들이 자신들이 마치 공권력인 마냥 자처하여 피의자들에게 응징을 가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을 집행하는 최고의 기관, 사법부를 상징하는 장소인 대법원 앞에 가면 정의의 여신상이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국의 정의의 여신상은 여타 다른 나라들의 정의의 여신상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다. 대개 정의의 여신상은 두 발로 서서 한 손에는 저울, 다른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있고 두 눈은 안대로 가리고 있다. 저울은 엄정한 정의의 기준이자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칼은 정의를 실현하는 힘으로 정의를 파괴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의미한다. 두 눈을 안대로 가리고 있는 것은 재판을 받는 자가 누구인지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의를 구성하는 이 세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야 진정한 정의가 실현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의의 여신상을 보면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한복을 입고 의자에 앉아있는건 차치하고서라도 두 눈을 가리지 않고 뜨고 있고, 한 손에는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있다. 두 눈을 부릅뜨고 당사자의 사정을 세세하게 살피고 헤아리며, 저울에 달아서 공정하게 심판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법전을 통해 정확한 판결을 내리고자 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청주 음주운전 역주행 사건, 송도 불법주차 사건, 두 사건의 죄질은 크게 다르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공권력은 나름대로의 심판을 내렸지만, 그것이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심판은 아니었다. 그리고 시민들은 오히려 피의자를 찾아가 응징하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자.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을 가지고, 피의자의 신상을 털고, 이미 법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시민들이 찾아가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다. 그들에게는 법의 대리인을 자처하여 한 시민에게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자격도 없을뿐더러, 자칫하면 오히려 무고한 제 2의 피해자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작금의 실태를 살펴보면, 그 심판을 관장해야할 사법부가 공명정대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국민들은 믿고 있지 않다. 시민들이 공권력을 대신하여 피의자를 응징하는 이 현상 자체가 이미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붕괴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30%대에 불과하며,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명 사법농단이 서서히 밝혀지면서 이미 삼권분립으로서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사법부의 존재이유와 그 신뢰조차 잃어버린 셈이다.
결코 법의 심판이 국민들의 감정을 해소하는 창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의를 실현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문제를 그 누구보다 공명정대하게 판결해주어야 하는 것이 법의 심판이다. 그러나 정의의 여신의 두 눈은 당사자의 사정을 세세하게 살피지 못하고 있으며, 칼 대신 법전을 쥠으로써 정의를 파괴하는 자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지 못하다. 결국 이러한 법의 심판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공권력을 대신하여 피의자를 응징하는 사건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기만 하는 상황이다.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분노한 시민들은 왜 생겨나는지, 정의를 심판해야할 사법부는 왜 신뢰를 잃어버렸는지, 결국 공권력의 종말은 누가 야기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