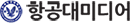한국항공대학교 도서관 대출대 맞은편 벽 위쪽에는 멋진 한시 구절의 편액(扁額)이 걸려 있다. 늘 무심히 지나치기만 했기에, 그게 언제부터 거기에 걸려 있었는지 알 수 없다. 어느 날 거기에 쓰인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桐千年老恒藏 曲(동천년노항장곡)’이라……! 누추한 한문 실력을 동원하여 떠듬떠듬 해석해 보니 그 의미가 자못 그윽하다. “오동나무는 천년을 늙어도 늘 곡(曲)를 품고 있다.” 오동나무(桐)와 곡(曲)에 어떤 숨은 의미가 있음이 틀림없는 듯하다.
알고 보니 이는 조선 중기의 문인 신흠(申欽)이 쓴 한시의 첫 번째 구절이다. 그의 문집 『야언(野言)』에 실린 이 한시의 전문을 읽어 보면 다음과 같다.
桐千年老恒藏曲(동천년노항장곡)
梅一生寒不賣香(매일생한불매향)
月到千虧餘本質(월도천휴여본질)
柳經百別又新枝(유경백별우신지)
오동나무(로 만든 거문고)는 천년 세월 동안 늙어도 제 곡조(曲調, 혹은 가락)를 품고 있고,
매화는 한평생을 추위에 떨더라도 제 향기를 팔지 않는다네.
달은 천 번을 이지러져도 제 본바탕은 여유롭게(혹은 풍부하게) 유지하고,
버드나무 가지는 백번을 꺾여도 다시 새 가지를 낸다네.
이 시는, 시간이 지나고 세상이 변해도 화자 자신이 추구하는 정신세계는 근본적으로 변함없이 품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한 정신을 오동나무(거문고), 매화, 달, 버드 나무가지 등의 자연물에 기대어 표현하고 있다. 허나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으랴? 세상 만물은 모두 변한다. 하지만 그 정신의 변화는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지는 내적 변화다. 그것은 ‘제 곡조’라고 해도 좋고 ‘제 향기’라고 해도 좋다. 그것은 ‘여유롭게’ 유지하며,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 이다.
그러고 보니 네 구절이 다 좋지만, 첫 구절이 특히 매력적이다. 오동나무란 그냥 나무가 아니라 오동나무로 만든 거문고이고, 곡(曲)은 거문고 곡조나 가락이다. 오동나무는 인 간으로 따지자면 귀족이다.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은 귀족이라기보다 내면적 삶의 높이와 깊이를 갖춘 정신적 귀족을 이르는 것이다. 저 전설의 새 봉황은 오로지 오동나무에 만 내려앉는다고 하지 않는가? 거문고 역시 예부터 선비들의 고결한 정신에 대응되는 악기다. 그 소리를 유장하고 그윽하다. 거문고는 오동나무로 만들어야 제격이다.
“남쪽 지방에 원추(鵷鶵)라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 남해(南海)에서 날아올라 북해(北海)까지 날아간다. 오동(梧 桐)이 아니면 앉지 않고 연실(練實, 멀구슬나무열매)이 아니면 먹지 않으며 예천(醴泉, 태평성세에만 단물이 솟는다 고 하는 샘)이 아니면 마시지 않는다.” 『장자(莊子)』의 「추수(秋水)」편에 나오는 장자의 말이다. 원추는 봉황의 일종이라 생각해도 무방하다. 남해에서 북해까지 날아간다는 것은 원추의 그 장엄한 외양과 그에 상응하는 정신세계를 드러내는 표현이고, ‘오동(梧桐)’, ‘연실(練實)’, ‘예천(醴泉)’ 은 모두 원추의 그 정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보조관념 이다.
신흠은, 선조, 광해군, 인조에 걸쳐 벼슬을 한 정치가이다. 임진왜란 때 신립 장군 휘하에서 조령 전투에 참가하기도 하고 서장관(일종의 외교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오기도 했다. 광해군 때는 인목대비 폐비와 영창대군 증살(蒸殺)에 반대한 혐의로 유배되기도 했으나(계축옥사), 인조 때는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좌의정과 영의정을 역임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정치가로서보다 조선 중기 한문학을 높은 경지까지 끌어올린 문필가로서 더 큰 이름을 남겼다. 그러면서도 한시로 못다 표현한 속내를 30수의 시조에 담기도 했다.
신흠의의 시조를 한 수 읽어 보자.
산촌(山村)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무쳐셰라.
시비(柴扉)를 여지 마라 날 차즈리 뉘 이시리.
밤즁만 일편명월(一片明月)이 긔 벗인가 하노라.
이 시조는 신흠이 광해군 당시 유배되었을 때의 심정을 노래한 것이다. 안 그래도 찾아올 사람 없는 산골 마을에 폭 설이 내려 돌길마저 파묻히니, 사립문마저 닫아걸고 겨울밤을 고독하게 보낸다. 한밤중 그의 마음을 위로하는 벗은 오로지 하늘에 걸린 한 조각 달뿐이다. 헌데 이 시조의 화자는 별반 괴로워하는 것 같지 않다. 저 혼탁한 세파로부터 물러 나 홀로 갇혀 있어 도리어 홀가분한 기분에 젖어 있는 듯하 다. 어찌보면 고독을 즐기는 듯도 하다. 흥미로운 점은 조선 시대 시가에서 흔히 ‘달’은 임금에 대한 은유로 드러나는데, 여기에서는 순수한 자연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자연 속에서 고독을 즐긴다고나 할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조선 최대의 전란을 겪고 계축옥사로 인하여 유배되기도 했으니, 신흠의 삶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하다고 해도 과하지 않다. 그의 시에는, 그가 순 탄치 않은 삶을 견디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정신세계를 굳건히 지키고자 한 노력이 여실히 드러난다. 신흠은 그야말로 고결한 정신적 귀족이라 할만하다. 혹여 프리드리히 니 체와 만나면, 서로 악수라도 나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서로 색깔은 다르지만 자기 색깔을 높고 깊게 일궈가는 그 정신세계가 닮아있다.
이 승 준(인문자연학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