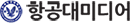경허와 만공의 도량(道場)
얼마 전, 천장암이라는 암자에 다녀왔다. 충청남도 서산시 연암산(燕巖山) 깊은 산속에 고즈넉이 자리잡고 있는 암자다. 근대 한국불교의 선(禪)을 다시 일으킨 경허(鏡虛)와 그의 제자 만공(滿空)이 수도하면서 많은 일화를 남긴 유서 깊은 암자다.
천장암은 하늘 밑 깊고 깊은 산 속에 숨어 있다. 사륜구동 자동차가 아니면 암자 아래 주차장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 주차장에서도 가파른 산길을 10여 분 올라야 한다. 눈이라도 쌓이면 천상 제 발로 걸어 오르지 않을 수 없는 곳이다. 경허와 만공이 백 수십 년 전 탁발을 하러 오르내리기란 보통 고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천장암은 한적하기 그지없다. 스님들은 모두 어디서 어떤 화두를 참구(參究)하는지, 인적 없이 간간이 새소리만 들려온다. 일일부작일일불식(一日不作百一日不食)이라고 작은 텃밭에 채소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을 뿐이다.
경허는 9세 때 서울 근교 청계산의 청계사에서 출가했다. 그는 14세에 청계사를 떠나 공주 동학사에서 만화 스님에게 경전을 배우고, 23세에 동학사 강사로 경전을 강론한다. 34세 때, 옛 스승 계허를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나는데, 심한 폭풍우에 쫓겨 한 마을에 찾아든다. 헌데 그곳은 전염병이 창궐하여 아비규환이었다. 그는 겁에 질려 부리나케 도망친다. 목숨을 건지고서는, 문자에만 매달려 마음으로는 전혀 깨닫지 못한 자신의 행동에 자괴감을 느낀다. 해서 강론을 전폐하고 선방에 들어, 두문불출 수도에 전념한다.
그러던 중 “어찌하여 소가 되더라도 콧구멍 없는 소(無鼻孔)가 되면 됩니까?” 하는 시자(侍子)의 물음에 문득 진리를 깨닫는다. 그의 오도송(悟道頌)은 다음과 같다.
忽聞人語無鼻孔(홀문인어무비공) 홀연 사람에게 ‘콧구멍 없다’ 말 듣고
頓覺三千是我家(돈각삼천시아가) 문득 깨달으니 삼천세계 곧 내 집일세
六月燕岩山下路(유월연암산하로) 유월 연암산 아래 길에
野人無事太平歌(야인무사태평가) 야인이 일없이 태평가 부르네.
35세에 경허는 동학사를 떠나 서산의 천장암으로 가서 그곳을 자신의 수선(修禪) 도량으로 삼는다.
천장암은 ‘삼월(三月)’로 불리는 경허의 세 제자가 모두 출가한 절이기도 하다. 먼저 수월(水月)이, 다음으로 만공(월면(月面))이, 이어서 혜월(慧月)이 출가했다. 그래서 이들을 각각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로 칭하기도 한다. 이 중 특히 만공은 경허의 선맥(禪脈)을 이었을 뿐 아니라 일제가 우리 불교를 왜색화하려고 획책한 사찰령을 일갈에 무너뜨린 고승이다. 1937년 일제는 사찰령을 관철하기 위해 조선의 31본산 주지들을 총독부로 불러 모았다. 다른 승려들이 모두 눈치만 보고 있을 때, 만공은 당시 미나미 총독에게 부당한 정책을 비판하며 호통을 쳤다. 이러한 만공에게 총독은 일본 여행을 제안하며 회유책을 내지만 만공은 거절한다.

천장암 한 편에는 경허와 만공의 방이 나란히 붙어있다. 두 방 모두 한 사람이 눕지도 못할 정도로 작다. 그 앞에 서니, 깊은 명상에 든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른다. 이 방에 얽힌 흥미로운 일화가 전한다. 어느 날 밤 어떤 여인이 경허의 방문을 두드려, 경허는 그녀를 방안으로 들인다. 경허는 그 여인과 머물며 그 방에 접근금지 엄명을 내린다. 여러 날이 지나자 경허의 불경스러운 행동에 참다못한 승려들이 항의하며 방문 앞에 선다. 헌데 알고 보니 여인은 얼굴이 짓무르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간 문둥이였다. 경허는 단 며칠이라도 그 여인이 편안하게 살도록 해 주고 싶었던 것이다.
경허는 기이한 행적을 많이 남긴 선승이다. 그는 술과 연인을 가까이하기도 했고, 거침없는 말로 선배나 스승 격인 고승들을 질타하기도 했다. 그래서 때때로 비방을 받기도 했으나, 그는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만사에 구애 없이 행동했다. 한암 스님이 쓴 ‘선사경허화상행장’에는, “하루는 뱀이 몸에 올라가 어깨와 등을 꿈틀꿈틀 기어갔다. 곁에 있던 사람이 보고 깜짝 놀라 말해 주었으나 태연히 개의치 않으니 조금 뒤 뱀이 스스로 물러갔다. 마음이 도와 합일한 경지가 아니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라는 글이 담겨 있다. 한암은 “스님의 법화를 배우는 것은 괜찮지만 스님의 행리를 배워서는 안 된다”고 경계한다. 섣부르게 함부로 흉내 내지 말라는 말이다.
천장암에서 일으킨 경허는 선풍은 수덕사, 개심사, 부석사 등 충남 일대뿐 아니라 범어사, 해인사, 통도사, 화엄사, 송광사 등 한반도 전역에 미친다. 그러한 경허가 59세에 홀연 세상에서 사라진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는 환속하여 박난주라고 개명하고, 함경도 갑산에 머물며 서당 훈장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다. 1912년 어느 날, 방에 들어가 큰 원을 하나 그리고 임종게를 남긴 뒤 천화(遷化)*하였다. 향년 67세, 법랍(法臘)* 58세였다.
그의 기행을 나로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범인(凡人)의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닌 듯하다. 분명 세속적인 욕심에는 무심하고, 승(僧)과 속(俗)을 넘어서, 마음만은 늘 청정했을 듯하다. 다시 ‘무비공(無鼻孔)’을 생각한다. 콧구멍이 없으면, 코뚜레를 뚫을 수 없고 그리하면 자유로울 수 있다는 뜻일까?
* 천화(遷化): 고승(高僧)의 죽음을 이르는 말.
* 법랍(法臘): 불교 승려가 된 뒤로부터 치는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