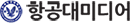봄의 심상
사실 이번 칼럼을 작성하기까지 많이 고민했던 것 같다. 기자에게 있어 칼럼을 쓴다는 건 흔히 주어지는 기회도 아니고 타인에게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순간들은 더더욱 적기 때문이다. 고민이 깊어질 때쯤 일상적인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가로등 옆 조그맣게 벚꽃 핀 가로수를 봤다. 불현듯 이때부터 무의식 속에 이번 칼럼은 ‘봄에 대해 노래하는 글을 써야겠다.’ 생각한 것 같다.
필자는 항상 그래왔다 칼럼으로 타인을 감화시키고 싶었다. 자신의 이상을 보여주고 다른 이들을 설득하고 싶었다. 필자의 태도와는 다르게 봄은 그런 것 같다. 자신을 맘껏 뽐내고 황홀한 감정으로 매료시킨다. “그것이 필자와 봄의 차이점이 아닌가!” 갖가지 방법들을 들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열심인 세상 속에서 봄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사람들을 설득하려 들지 않는다. 사람들은 오감을 자극하는 봄의 요소들에 자연스럽게 매료되어 있을 뿐이다.
서로를 이해시키는 데 급급하고 다양함과 다름을 쉽사리 인정하지 못하는 인간사회에 이 계절은 보란 듯이 상대로부터 사랑받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남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 질문의 답을 봄은 알고 있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다른 이들에게 사랑받는 법이라고 나 자신조차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남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겠냐며... 우리 자신을 숨기고 감추지 말자 타인에게 맞추려 들지도 말자 마음속 진정한 나 자신을 사랑하자 맘껏 뽐내자, 그런 봄처럼.
봄의 노래
이 계절은 독특한 힘을 가지고 있다. 따스한 볕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고 산들바람으로는 기분 좋은 장난을 친다. 오직 이뿐일까 겨울을 견디고 돋아난 푸름은 시각적인 경이로움뿐 아니라 향긋한 향기로 또 한 번 감동을 준다. 추운 겨울 졸린 눈을 비비며 두터운 옷을 입고 지하철에 오르던 풍경은 봄이 된 어느새 기지개를 켜고 따뜻한 햇볕을 맞으며 잠깐이라도 행복감을 느끼는 감정들로 밀어내게 되었다. 그런 봄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시린 기억을 밀어내고 하염없이 따뜻함만 내어주는 봄, 우리도 그런 조건 없는 따뜻함을 세상에 보이자.
봄의 특별함
봄이라는 계절은 우리 사이 특별함을 더해준다. 각별한 우리 사이 관계에서 봄이라는 다리는 더 큰 감정을 느끼게 해준다. 함께 보내는 이 계절의 순간은 어지러울 정도로 향긋한 선물을 우리에게 준다. 어쩌면 그런 순간들을 함께한 우리는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일 것이다. 익숙해져 버린 일상 속 반복되는 계절 중 하나지만 봄만큼은 매번 느끼는 광경과 변화에 어색하리만큼 이따금 푸릇푸릇한 설레는 새로운 감정을 고이고이 꺼내 우리에게 보여준다.
봄의 찰나
봄은 찰나의 순간 모든 걸 보여주고 떠난다. 형형색색의 꽃들은 마치 짧은 이 순간들을 기다려 왔다는 듯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여주지 않던 얼굴을 힘껏 자랑하고 과실을 맺으려 사라진다. 여름이나 겨울과 같은 계절들은 오랜 시간 변함없는 자기 모습을 보여주기에 그와 반대되는 봄과 가을이 아쉬울 따름이다. 그러니 지금 순간을 만끽하자 어쩌면 짧은 순간에 모든 생각고 감정들을 담아두기에 행복감과 만족감을 배로 주고 긴 여운을 남기는 계절일지도 모른다.
서로를 닮은
계절이란 결국엔 지나가는 순간일 뿐인데 나는 왜 이렇게 봄이라는 계절이 옴에 기쁘고 가슴이 떨리는 신남을 느낄까. 어쩌면 우리 모두 이 순간을 바라왔을지도 모른다. 조금은 쌀쌀해지고 마음조차 쓸쓸해지는 가을을 거치고 추위에 떨고 움츠려있던 겨울을 지나 비로소 웅크린 몸을 일으키는 태동을 한다. 우리의 삶도 계절도 모두 반복되는 익숙함이지만 이 둘 다 빛을 보기 위해 인고하고 살아가는 점과 봄의 새싹을 키우고 여름의 뜨거운 햇빛을 맞이하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닮아있다. 작년의 나는 어땠을까? 따뜻한 봄 청춘을 노래하며 뛰놀았고 더운 여름 너무나 큰 행복감을 느끼며 기쁨에 가득 찼다. 서늘해진 가을 행복감이 사라질까 두려웠고 추운 겨울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 인고했다. 작년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모두 경험했다 따뜻한 봄을 지나 찬란한 여름을 맞이할 것이고 춥고 고달픈 시련의 시기도 겪을 것이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결국 눈이 녹고 꽃이 피는 계절이 옴을 우리 눈에 기억하자 아니 오감을 모두 사용하여 각인시키자.
창에 드는 볕이 어느덧 봄이다. 봄은 맑고 고요한 것, 창덕궁의 가을을 걸으며 낙엽을 쥐어 본 것이 작년이란 말인가 나는 툇마루에서 봄볕을 쪼이며 창덕궁의 가을을 연상한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 가을 위에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온 것이다. 그러기에 지나간 가을은 해가 멀어갈수록 아득하게 호수처럼 깊어 있고 오는 봄은 해가 거듭될수록 쌓이고 더욱 부풀어가지 않는가. 「 봄 – 윤오영 」
arrberry@kau.kr
나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