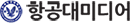지난해 겨울 아내와 함께 며칠간 경주를 여행했다.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다녀온 후 십여 차례 여행한 바 있지만, 언제 가도 그 그윽한 역사적 향기에 취하는 곳이 경주다. 돌아오는 길에 문경온천에 들러 몸을 풀고 집으로 향하려 하는데, 근방에 신라 문인 최치원과 인연이 있는 봉암사란 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조용한 암자에 들러 한적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여행의 매력 중 하나다. 예정에 없다면 더욱 좋고, 작고 소박하면 더욱더 좋고, 알려지지 않은 절이라면 더더욱 좋다. 해서 봉암사로 향했다.
봉암사로 향하는 길은 제법 운치 있고, 고즈넉한 느낌이 들었다. 헌데 절문에 들어서기도 전에, 바리케이트가 우리의 앞길을 막아섰다. 차를 길 한쪽에 세워두고 경비실에 가서 물으니, 봉암사는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절이라는 것이다. 일년 중 단 하루, 부처님오신날에만 일반인의 출입을 허가한다고 한다. ‘허허, 이런 절이 있었나?’ 불자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제법 절 구경을 해 왔다고 여겼는데, 나의 지식과 경험이 얼마나 일천(日淺)한가를 새삼 깨달았다. 후일을 기약하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발길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봉암사는 신라 헌강왕 5년 지증국사가 창건한 천년고찰이다. 백두대간의 단전(丹田)에 해당하는 문경 희양산 남쪽에 자리하고 있는데, 봉황과 같은 바위산 아래로 용의 향상으로 계곡이 흐르고 있어 예로부터 그 일대를 봉암용곡(鳳巖龍谷)이라 했다. 지증국사는 그 웅숭깊은 산의 형세를 보고, “스님들의 거처가 되지 못하면 도적의 소굴이 될 것”이라 여기고 봉암사를 창건했다. 이후 쇠퇴와 중창을 거듭하면서, 근대에 이르러 버려지다시피 하여 낙백(落魄)을 면치 못하다가, 봉암사는 해방 직후 극적인 새 전기를 맞이한다.
1947년 성철을 비롯하여 청담, 자운, 우봉 등 네 명의 스님이, 바로 이 봉암사에서 “오직 부처님 법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뜻으로 뭉쳐 결사 도량을 꾸민 것이다. 이른바 ‘봉암사 결사’다. 1911년 일제는, 한국 불교를 일본화하고 우리의 민족정신을 말살하여 독립 의지를 꺾으려고 ‘사찰령’을 발표한다. 이로 인하여 대처승 제도가 자리 잡게 되어 한국 불교의 정신은 쇠락하고, 해방 후 사찰은 승려 가족의 이익을 위한 터전으로 전락하고 만다. ‘봉암사 결사’는 이러한 타락한 불교의 쇄신을 위한 지난한 각성의 표현이었다.
여기에 청담, 행곡, 도우 등 스무 명의 승려가 이 결사에 참여하여 진정한 참선의 터전을 일구지만,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결사는 해체되고 만다. 그래도 그 정신은 한국 불교에 참선의 큰 뿌리를 내리게 되어, 1970년대 전후에 뜻 있는 수좌들이 이 봉암사에 모여 향곡을 조실로 모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부처의 참 정신을 수양하는 도량을 다시 연다. 그리하여 1982년 조계종은 봉암사를 특별수도원으로 지정하고, 문경군이 사찰 경내지를 확정고시하면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다. 안거 기간에 전국에서 몰려든 수좌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니, 일반인은 물론이고 승려들에게도 봉암사의 문턱은 높디높다.
얼마 전 ‘천년 산문이 열린다’는 뉴스가 공개되면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작년 봄, 봉암사 절 밖에, ‘국민 선방’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세계명상마을’이 문을 열었다. 이에 명상마을은 참가자들의 봉암사 순례를 요청했고, 봉암사 주지는 이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찰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결국 사찰은 입장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봉암사 측의 사과도 있었다. 아마도 쉬운 결정은 아리었으리라 짐작된다. 부처님의 승가공동체 정신을 살려 민주적으로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봉암사의 운영 체계의 특성을 볼 수 있다.
몇 년 전에는 이러한 운영 체계에 위협을 가하는 사건도 있었다. 조계종이 ‘선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봉암사 주지 임명권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이다. 봉암사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게 발의의 이유다. 하지만 사실상 이 발의의 뒤에는, 조계종의 적폐 청산에 나섰던 봉암사 수좌들의 통제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게 중론이다. 봉암사 수좌들은 대체로 참선에만 열중할 뿐 불교 행정에는 무관심해, 한때 조실 자리가 공석인 적도 있지만,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보다 성숙한 운영 체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발의는 취소되었지만, 위협은 상존한다.
올해 5월,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자 봉암사 생각이 났다. 절 구경도 할 겸 나들이도 할 겸 문경으로 향했다. 봉암사 근처에 있는 대야산자연휴양림에서 이틀을 머물렀다. 새벽 5시에 절문이 열리고, 6시가 되면 신도들이 몰려 교통정리를 위해 경찰이 출동한다고 한다. 그래서 도리어 좀 늦게 가면 불공을 드리러 가는 신도들이 좀 빠지지 않을까 하는 심산에서, 오전 10시가 지나 느긋하게 절을 향해 출발했다. 그런데 웬일인가! 10리 밖에서부터 봉암사로 향하는 차들이 장사진(長蛇陣)을 이루고 있었다. 봉암사와는 인연이 닿지 않는 모양이라고 여기며, 다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작년 겨울 처음 봉암사를 알게 된 후부터, “이렇게 산문을 닫는 것이 과연 부처님의 뜻일까?” 하는 의문이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양한 생각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그 취지가 변색하지만 않고 제 자리에서 제 역할만 잘 수행해 준다면, 우리 사회에 이러한 사찰이 하나쯤 있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기운다. 그 향기로운 뜻이 온 세상에 퍼져, 이 언덕(彼岸)을 조금이나마 정화할 수 있다면 고마운 일이다.
봉암사 대웅전 오른쪽 끝에는 ‘佛身普遍十方中(불신보변시방중)’*라고 쓰인 주련(柱聯)이 걸려 있다고 한다. 의역을 하면, “부처님은 두루두루 천지 사방 어디에나 계신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어디엔들 부처님이 없을까? 굳이 봉암사가 아니라도 좋다”는 생각으로 아쉬움을 달랜다.
* ‘佛身普遍十方中(불신보변시방중)’에서 ‘普遍’을 ‘보편’으로 읽지 않고 ‘보변’으로 읽는 데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