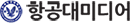이번 학기에 유준 교수님의 세계문학감상이라는 수업을 듣게 되었다. 이 수업은 주차 별로 정해진 책을 미리 읽어 와야 하는 조금은 귀찮을 수 있는 수업이다. 하지만 핸드폰과 책 중에 번번이 핸드폰을 선택해 왔던 필자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수업이었다. 매주 꾸준히 책을 읽게 되었으니 말이다. 아무튼 이번 주에는 톨스토이의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읽게 되었다. 줄거리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반 일리치는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나 무뚝뚝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랬던 그가 갑자기 불치병에 걸리게 되면서, 일상생활도 못 할 만큼 쇠약해지고 만다.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쳐가던 그였지만, 자존심을 지키느라 속에 있는 얘기를 쉽사리 털어놓지 못한다. 그러다 임종이 가까워질 때쯤, 자존심이 얼마나 삶에서 의미 없는 것인지 깨닫고 참회하게 된다.
이반 일리치를 보면 꼭 나를 보는 것 같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대전 성심당에서 빵을 사려고 줄을 섰다가 잠시 손가방을 땅바닥에 내려놓았다. 핸드폰을 주머니에서 꺼내려는데 손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물었다. “왜 짐을 나한테 안 맡기고 땅바닥에 두는 거야?” 진심으로 궁금한 표정을 짓길래, 곰곰이 내 행동을 되짚어 보았다. 그건 나도 모르게 나온 내면화된 습관이었다.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어쩐지 자존심이 상했고,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싫었다. 그렇게 혼자 이겨내는 걸 당연시 하는 바람에, 사소한 것도 부탁하지 않는 게 버릇이 되어 버렸다. 그렇게 내가 나를 고립시켰다.
주변에 의지할 줄을 모르다 보니, 혼자서 많은 것을 감당해야 했다. 그래도 항상 끙끙대면서 이겨내 왔다. 최근에 이력서를 쓰고 있는데 오랜만에 친한 형한테 연락이 왔다. 반가운 마음에 대화를 이어 나가다가 갑자기 훅 들어온 말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울컥하게 되었다. “고마워! 주원이도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야” 라는 말이었다. 이 말을 들으니 눈물이 핑 돌았다. 사실 나도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러나 기대는 건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잘못된 편견 속에 살아가느라, 약해진 나를 살피지 못했다. 주변에 아무도 안 남아도 나는 괜찮다고 오만하게 굴었고, 부지런히 나를 ‘강인한 사람’이라는 껍질로 포장해 왔다. 실상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 고팠던 인간이었다.
여러 사건을 계기로 생각을 많이 고쳐먹고, 뒤늦게 주변에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더니, 고민도 털어놓으니 훨씬 일상이 가벼워졌고, 염려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자기 일처럼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었다. 지금까지 주변의 잠재력을 너무 무시해 왔던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다. 주변의 도움으로 차츰차츰 껍데기를 깨고, 나를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 주변에 도움을 청해도 창피하지 않은 요즘의 내가 예전의 나보다 훨씬 마음에 든다.
이로써 신문사에서의 마지막 칼럼이 마무리되었다. ‘퇴임 기자의 변’을 다 쓰고 나니, 졸업이 코앞으로 다가온 게 진짜 실감이 난다.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좋은 날도, 힘든 날도 참 많았다. 소중한 기억을 가득 안고 필자는 이만 물러나겠다. 여러분도 우리 대학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쌓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