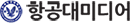지난 주 『항공대신문』의 「북 카페」라는 작은 난(欄)에 향수라는 책 소개가 실렸다. 책의 내용은 감춘 채, 그 매력만을 살짝 드러내 보여주려는 의도였을까? ‘파리의 악취’, ‘악마의 선물’, ‘향기’, ‘아이러니’, ‘인간의 냄새’, ‘엽기적인 살인사건’, ‘욕망과 잔혹함’ 등의 자극적이면서도 매혹적인 어구들로 채워진 세 문장만이 이 책을 소개하고 있었다. 그 위에 실린 책의 표지그림이 작아서 작가 이름조차 알 수 없었다. 그러니 책을 읽어 본 이가 아니라면, 그 내용을 짐작하기란 요령부득이었다. 다른 독자는 과연 이 난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으나, 이 글을 쓰게 만들었으니 그것은 적어도 나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한 셈이다.
1990년 대 중반, 한때 파트리크 쥐스킨트가 문학가의 관심사였다.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나는 그의 향수를 읽게 되었다. 주인공 그루누이는 냄새구렁이 생선좌판 밑에서 태어났기에 상상을 초월하는 후각을 지닌다. 반면 그의 몸에서는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다. 설정이 다소 과장되었지만, 쥐스킨트의 문체의 힘은 그러한 과장을 실감나게 만들었다. 그 초월적 후각은 그를 향수 제조자로 이끈다.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데서 오는 내면적 상처는 향수에 대한 그의 열정에 불을 댕긴다. 인간의 모든 욕망과 가치를 넘어서는 최고의 향수를 만드는 데 그 열정이 바쳐진다. 그는 젊은 여인의 육체에서 추출한 정제액으로 향수를 제조한다. 향수를 만들기 위한 연쇄살인인 벌어진다.
고개를 내두르는 분들도 있었지만, 『향수』가 내게는 매우 신선했다. 여기서 향수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는데, 예술작품에 대한 은유라고 생각해도 좋을 듯하다. 예술이 감각의 세계에 속한다는 점에서, 그루누이의 후각은 예술 세계를 대변하기에 적절하다. 그루누이는 흔히 예술가들에게 예술적 힘의 바탕이 되는 내면적 상처도 지니고 있다. 문제는 살인이라는 방법이다. 여기서 예술과 윤리는 극단적으로 충돌한다. 지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인간 여럿쯤 죽어나가도 좋은 것일까? 이런 점에서 그루누이의 태도는 예술지상주의를 극한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루누이는, 죽은 여인들이 향수로 재탄생되었다고 믿는지도 모른다.
최고의 예술작품, 그 감각적 아름다움의 극치가 실재한다면,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기 어렵다. 모든 이가 그에 고개를 숙이며 경의를 표할까? 일부 천재만이 알아보는 것이기에 범인(凡人)들은 그에 고개를 돌리며 혐오하게 될까? 쥐스킨트는 그것을 욕망의 극치라고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다. 끝내 그루누이는 최고의 향수 제작에 성공하게 되는데, 그가 완성한 향수를 열었을 때 참혹한 상황이 벌어진다. 그 향에 취해 몰려든 이성 잃은 군중에 의해 그의 육체는 분해되어 사라져버리고 만다. 이 장면은 마치 바그너의 가극처럼 웅장하게 그려지고 있다. 쥐스킨트는 여기에서 그로테스크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나는 이 소설을 읽자마자, 소설 『좀머 씨 이야기』를 곧 바로 읽었다. 당시 독서가에서 『좀머 씨 이야기』의 인기는 대단했다. 이 소설은 주인공 소년의 유쾌한 성장이야기이다. 그런데 그 뒤에는 역사의 희생자처럼 암시되는 좀머 씨의 인상적인 모습이 어른거린다. 좀머 씨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 년 내내, 길쭉한 지팡이와 텅 빈 배낭을 메고, 호수 주위를 잰걸음으로 말없이 바삐 걷는 사람……. 소설을 다 잃어도 그는 여전히 수수께끼의 인물이지만, 그가 무언가 깊은 상처에 고통스러워한다는 점은 짐작할 수 있다. 그 상처가 나치와 관계된 것처럼 암시된다. 그러한 좀머 씨의 모습이 발랄한 소년의 눈에 의해 비쳐진다. 소년을 생각하면 지금도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지만, 좀머 씨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말없는 좀머 씨……. 하지만 소년은 그가 분명하게 하는 말을 딱 한번 들었다고 한다. 비와 우박이 세차게 몰아치는 일요일, 소년은 아버지와 자가용을 타고 경마장에 간다. 소년과 아버지는, 그날도 잰걸음으로 걷고 있는 좀머씨를 발견한다. 아버지는, “그러다가 죽겠어요!”라고 말하며 좀머 씨에게 재차 삼차 자가용에 타라고 권한다. 하지만 좀머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길을 걷는다. 아버지가 다시 차에 탈 것을 권하자, 좀머 씨는 “그러니 나를 제발 그냥 놔두시오.”라고 말한다. 그에 대해, “저 사람 완전히 돌았군.” 하고 내뱉는다. 아버지는 좀머 씨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소년은 그를 이해하는 것이 분명하다.
희곡 『콘트라베이스』도 만만치 않았다. 화려한 오케스트라의 중심에서 벗어난 커다란 악기 콘트라베이스……. 그것은 소외된 악기다. 실제로 그 악기의 연주가들은 불쾌할지도 모르겠으나, 작가의 생각에는 동의한다. 쥐스킨트는 그 악기를 통해서 소외된 인간의 내면적 상처를 보여준다. 어쩌면 누구나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를 연주하고 싶을 지도 모른다. 아니면 첼로를 더 멋지게 연주하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대개 콘트라베이스 연주자로 살아간다. 이 희곡은 연극으로도 성공을 거두었다. 이제 정치가처럼 된 배우 명계남이 광고계에서 돌아와 이 작품으로 다시 무대에 섰다. “난 어찌 되었든 성 때문에 항상 명배우죠”라며 너스레를 떨던 그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역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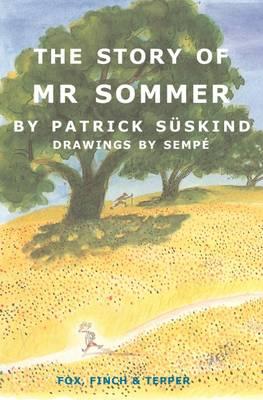
그 다음에 나왔던 『비둘기』와 『깊이에의 강요』는 전작에 비하면 좀 시시했다. 그는 여전히 내 마음 한 편에 매력적인 작가로 남아 있지만, 그 후 그는 나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나의 관심과 상관없이 그는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상을 거부하며 세상에 얼굴을 내밀지 않고 숨어 산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좀머 씨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쥐스킨트가 바로 좀머 씨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1995년 중반 좀머 씨에게 열광한 사람들도 알고 보면 모두 좀머 씨가 아닐까? 나 역시 그러하다. 좀머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귓가에서 맴돈다. “그러니 나를 좀 제발 그냥 놔두시오!”